%EC%BB%B4%ED%93%A8%ED%84%B0
-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학술대회 ICCV 2025에 논문 12편 채택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이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 학술 대회 중 하나인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25(ICCV 2025)에 채택되어, 연구팀의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ICCV는 CVPR, ECCV와 함께 컴퓨터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로, 198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ICCV 2025에는 총 11,15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이 중 2,698편이 채택되어 약 24.19%의 낮은 채택률을 기록하였다. 학술대회에 제출할 수 있는 논문 편수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연구실에서 12편의 논문이 동시 채택되는 것은 매우 드문 성과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학습 기반의 시각 지능 구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12편의 논문들은 3D 객체 탐지 및 재구성, 동작 예측 및 계획, 악천후나 모션 블러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영상 인식 및 개선, 테스트 시점 적응 및 멀티태스크 학습, 4D 맵을 활용한 재구성과 같은 컴퓨터비전 분야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논문들이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해 CVPR 2024와 ECCV 2024에서도 각각 9편과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ICCV 2025에서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선두 연구실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가며 학문적·기술적 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ICCV 2025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30 조회수 330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학술대회 ICCV 2025에 논문 12편 채택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이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 학술 대회 중 하나인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25(ICCV 2025)에 채택되어, 연구팀의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ICCV는 CVPR, ECCV와 함께 컴퓨터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로, 198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ICCV 2025에는 총 11,15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이 중 2,698편이 채택되어 약 24.19%의 낮은 채택률을 기록하였다. 학술대회에 제출할 수 있는 논문 편수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연구실에서 12편의 논문이 동시 채택되는 것은 매우 드문 성과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학습 기반의 시각 지능 구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12편의 논문들은 3D 객체 탐지 및 재구성, 동작 예측 및 계획, 악천후나 모션 블러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영상 인식 및 개선, 테스트 시점 적응 및 멀티태스크 학습, 4D 맵을 활용한 재구성과 같은 컴퓨터비전 분야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논문들이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해 CVPR 2024와 ECCV 2024에서도 각각 9편과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ICCV 2025에서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선두 연구실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가며 학문적·기술적 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ICCV 2025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30 조회수 330 -
 VR 정밀포인팅·안무 창작 기술, 세계 최고 CHI 학회 2관왕
가상공간에서는 정확하게 포인팅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상을 정확히 선택하기 어렵고, 몰입이 깨지는 어색한 경험을 하게 된다. KAIST 연구진이 가상공간에서 생생하게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주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또한 안무가들의 안무 동작을 쉽게 만들고 창작을 돕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우리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윤상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양장(YangZhang)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티투아이레이(T2IRay)’ 기술과 가상현실에서 안무가들이 창작 작업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코레오크래프트(ChoreoCraf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CHI) 2025*에서 상위 5%에 주어지는 우수 논문상(Honorable Mention)을 동시 2개 수상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학회(CHI):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 세계 컴퓨터 연합회(ACM) 주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학술대회(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2025)
티투아이레이(T2IRay)는 기존의 단편적인 엄지와 검지(Thumb to Index) 제스처를 확장하여, 가상공간 안의 물체를 자유롭고 정밀하게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에는 손의 위치나 방향이 달라져도 입력이 끊기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티투아이레이에서는 손의 위치나 방향과 관계없이 정밀한 포인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훨씬 자연스럽고 끊김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가락 관계성을 바탕으로 로컬 좌표계를 활용하여 손 위치 및 방향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엄지의 섬세한 움직임을 좌표계 안에서 매핑하여 정밀하게 인식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입력에 반영하여 넓은 범위에서도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다.
윤상호 교수는 “티투아이레이는 손이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강·가상현실(AR/VR)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AIST 김진아 박사과정이 제 1저자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신진연구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논문명 : T2IRay: Design of Thumb-to-Index based Indirect Pointing for Continuous and Robust AR/VR Input
▴ 논문 링크: https://doi.org/10.1145/3706598.3713442
▴ T2IRay: https://youtu.be/ElJlcJbkJPY
또한, 윤상호 교수 연구팀은 가상현실에서 안무가들이 창작 작업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코레오크래프트(ChoreoCraft)' 기술을 개발했다.
전문 안무가 대상의 경험 조사를 통해 창작 과정 내 안무가들이 직면하는 동작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거나 아이디어가 막히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춤 동작을 모션 캡쳐 기반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 동작을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 의존을 줄였으며 음악 및 이전 동작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무를 추천해 창작을 도왔다. 또한 균형감, 안정성, 활성도 등 운동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기반 안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과정의 객관성도 높였다.
윤상호 교수는 “코레오크래프트는 안무가들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실제 안무가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실험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정량적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라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간 컴퓨팅을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기술을 융합해,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인간 중심 인터랙션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은 박사과정과 한현영 석사과정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인 해당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예술실감서비스개발사업인 실시간 실가상 융합 기반 공연예술 교육 플랫폼 기술개발의 지원 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원밀리언(대표 김혜랑)과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 논문명 : ChoreoCraft: In-situ Crafting of Choreography in Virtual Reality through Creativity Support Tool
▴ 논문 링크: https://doi.org/10.1145/3706598.3714220
▴ Choreocraft: https://youtu.be/Ms1fwiSBjjw
2025.05.13 조회수 2129
VR 정밀포인팅·안무 창작 기술, 세계 최고 CHI 학회 2관왕
가상공간에서는 정확하게 포인팅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상을 정확히 선택하기 어렵고, 몰입이 깨지는 어색한 경험을 하게 된다. KAIST 연구진이 가상공간에서 생생하게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주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또한 안무가들의 안무 동작을 쉽게 만들고 창작을 돕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우리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윤상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양장(YangZhang)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티투아이레이(T2IRay)’ 기술과 가상현실에서 안무가들이 창작 작업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코레오크래프트(ChoreoCraf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CHI) 2025*에서 상위 5%에 주어지는 우수 논문상(Honorable Mention)을 동시 2개 수상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학회(CHI):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 세계 컴퓨터 연합회(ACM) 주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학술대회(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2025)
티투아이레이(T2IRay)는 기존의 단편적인 엄지와 검지(Thumb to Index) 제스처를 확장하여, 가상공간 안의 물체를 자유롭고 정밀하게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에는 손의 위치나 방향이 달라져도 입력이 끊기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티투아이레이에서는 손의 위치나 방향과 관계없이 정밀한 포인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훨씬 자연스럽고 끊김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가락 관계성을 바탕으로 로컬 좌표계를 활용하여 손 위치 및 방향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엄지의 섬세한 움직임을 좌표계 안에서 매핑하여 정밀하게 인식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입력에 반영하여 넓은 범위에서도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다.
윤상호 교수는 “티투아이레이는 손이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강·가상현실(AR/VR)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AIST 김진아 박사과정이 제 1저자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신진연구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논문명 : T2IRay: Design of Thumb-to-Index based Indirect Pointing for Continuous and Robust AR/VR Input
▴ 논문 링크: https://doi.org/10.1145/3706598.3713442
▴ T2IRay: https://youtu.be/ElJlcJbkJPY
또한, 윤상호 교수 연구팀은 가상현실에서 안무가들이 창작 작업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코레오크래프트(ChoreoCraft)' 기술을 개발했다.
전문 안무가 대상의 경험 조사를 통해 창작 과정 내 안무가들이 직면하는 동작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거나 아이디어가 막히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춤 동작을 모션 캡쳐 기반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 동작을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 의존을 줄였으며 음악 및 이전 동작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무를 추천해 창작을 도왔다. 또한 균형감, 안정성, 활성도 등 운동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기반 안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과정의 객관성도 높였다.
윤상호 교수는 “코레오크래프트는 안무가들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실제 안무가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실험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정량적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라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간 컴퓨팅을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기술을 융합해,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인간 중심 인터랙션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은 박사과정과 한현영 석사과정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인 해당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예술실감서비스개발사업인 실시간 실가상 융합 기반 공연예술 교육 플랫폼 기술개발의 지원 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원밀리언(대표 김혜랑)과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 논문명 : ChoreoCraft: In-situ Crafting of Choreography in Virtual Reality through Creativity Support Tool
▴ 논문 링크: https://doi.org/10.1145/3706598.3714220
▴ Choreocraft: https://youtu.be/Ms1fwiSBjjw
2025.05.13 조회수 2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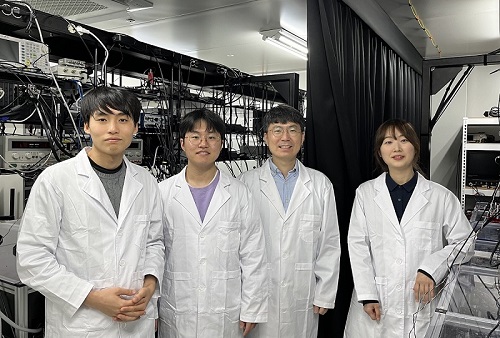 양자 컴퓨터 오류정정에 필요한 양자얽힘 구현
양자 컴퓨팅은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자 기술이다.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정확히 수행하려면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양자얽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큰 난관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 라영식 교수 연구팀이 양자오류 정정 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를 실험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측정기반 양자 컴퓨팅은 특수한 양자얽힘 구조를 가진 클러스터 상태를 측정하여 양자 연산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자 컴퓨팅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의 제작에 있으며, 범용 양자컴퓨팅을 위해 2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상태가 사용된다.
하지만 양자연산에서 발생하는 양자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Fault-Tolerant Quantum Computing)으로 발전하려면 더욱 복잡한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상태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2차원 클러스터 상태 제작이 보고됐지만,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에 필요한 3차원 클러스터 상태는 양자얽힘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그동안 실험 구현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팀은 펨토초 시간-주파수 모드를 제어하여 양자얽힘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를 생성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펨토초 레이저는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 펄스를 방출하는 장치로, 연구팀은 비선형 결정에 펨토초 레이저를 입사시켜 여러 주파수 모드에서 양자 광원을 동시에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양자얽힘을 생성했다.
라영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3차원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 제작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측정 기반 양자컴퓨팅 및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학과 노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하고 곽근희, 윤영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저명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025년 2월 24일 온라인판으로 정식 출판됐다. (논문명: Generation of three-dimensional cluster entangled state, DOI: 10.1038/s41566-025-01631-2)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사업,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 및 미국 공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5.02.25 조회수 3473
양자 컴퓨터 오류정정에 필요한 양자얽힘 구현
양자 컴퓨팅은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자 기술이다.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정확히 수행하려면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양자얽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큰 난관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 라영식 교수 연구팀이 양자오류 정정 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를 실험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측정기반 양자 컴퓨팅은 특수한 양자얽힘 구조를 가진 클러스터 상태를 측정하여 양자 연산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자 컴퓨팅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의 제작에 있으며, 범용 양자컴퓨팅을 위해 2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상태가 사용된다.
하지만 양자연산에서 발생하는 양자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Fault-Tolerant Quantum Computing)으로 발전하려면 더욱 복잡한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상태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2차원 클러스터 상태 제작이 보고됐지만,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에 필요한 3차원 클러스터 상태는 양자얽힘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그동안 실험 구현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팀은 펨토초 시간-주파수 모드를 제어하여 양자얽힘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를 생성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펨토초 레이저는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 펄스를 방출하는 장치로, 연구팀은 비선형 결정에 펨토초 레이저를 입사시켜 여러 주파수 모드에서 양자 광원을 동시에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3차원 구조의 클러스터 양자얽힘을 생성했다.
라영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3차원 클러스터 양자얽힘 상태 제작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측정 기반 양자컴퓨팅 및 결함 허용 양자컴퓨팅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학과 노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하고 곽근희, 윤영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저명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025년 2월 24일 온라인판으로 정식 출판됐다. (논문명: Generation of three-dimensional cluster entangled state, DOI: 10.1038/s41566-025-01631-2)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사업,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 및 미국 공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5.02.25 조회수 3473 -
 차미영 교수, 2024 ACM Distinguished Member 선정
우리대학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가 미국 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Distinguished Member(특훈회원)’로 선정됐다.
차 교수는 허위 정보 분석, 사기 감지, 빈곤 맵핑(Poverty Mapping) 등 계산 사회과학(Computational Social Science) 연구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CM Distinguished Member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후학과 연구자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다. ACM은 2006년부터 전체 회원 중 상위 10% 이내에서 Distinguished Member를 선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2008년 우리 대학 전산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년 KAIST에 부임해 현재 ‘인류를 위한 데이터과학(Humanity for Data Science)’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병행하며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17 조회수 1830
차미영 교수, 2024 ACM Distinguished Member 선정
우리대학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가 미국 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Distinguished Member(특훈회원)’로 선정됐다.
차 교수는 허위 정보 분석, 사기 감지, 빈곤 맵핑(Poverty Mapping) 등 계산 사회과학(Computational Social Science) 연구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CM Distinguished Member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후학과 연구자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다. ACM은 2006년부터 전체 회원 중 상위 10% 이내에서 Distinguished Member를 선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2008년 우리 대학 전산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년 KAIST에 부임해 현재 ‘인류를 위한 데이터과학(Humanity for Data Science)’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병행하며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17 조회수 18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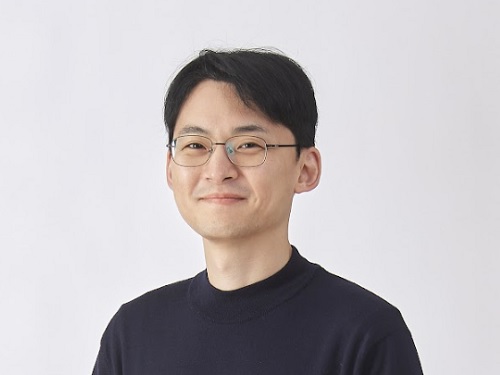 전산학부 성민혁 교수,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 수상
우리 대학 전산학부 성민혁 교수가 2024 아시아그래픽스(Asiagraphics) 젊은 연구자상(Young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젊은 연구자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내의 연구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 주어진다. 성민혁 교수는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기하학 처리 분야에서의 중요한 기여가 큰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은 2018년부터 수상을 하였으며, 성민혁 교수의 수상은 한국인 최초이다.
성민혁 교수는 2019년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Adobe Research에서 연구 과학자로 활동한 뒤 2021년도에 KAIST에 교수로 부임했다. 그의 연구는 주로 기하학 처리에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분야에 집중되며, 3D 객체의 구성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기하학 처리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를 해왔다. 특히, 성 교수는 3D 객체 분할, 생성/완성, 그리고 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냈다. 성민혁 교수의 연구는 또한 3D 객체의 변형 가능성을 학습하고 이를 3D 객체 검색 및 편집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최근 성 교수는 3D 생성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그리고 메시(Mesh)와 NeRF/Gaussian Splats 편집 등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에 대한 생성 모델 기법을 확장하고 있다.
성민혁 교수는 SIGGRAPH Asia (2022, 2023), Pacific Graphics (2023), Eurographics (2022, 2024, 2025), ICLR (2025) 등의 주요 학술대회에서 기술 프로그램 위원으로 활동하며, Graphics Models 저널에서는 2022년부터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Asiagraphs Webinar의 워킹 팀에서도 활동 중이다.
성 교수는 이번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 수상으로 그동안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기하학 처리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의 미래의 연구 리더로서 기대를 모은다.
2024.11.26 조회수 3175
전산학부 성민혁 교수,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 수상
우리 대학 전산학부 성민혁 교수가 2024 아시아그래픽스(Asiagraphics) 젊은 연구자상(Young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젊은 연구자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내의 연구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 주어진다. 성민혁 교수는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기하학 처리 분야에서의 중요한 기여가 큰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은 2018년부터 수상을 하였으며, 성민혁 교수의 수상은 한국인 최초이다.
성민혁 교수는 2019년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Adobe Research에서 연구 과학자로 활동한 뒤 2021년도에 KAIST에 교수로 부임했다. 그의 연구는 주로 기하학 처리에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분야에 집중되며, 3D 객체의 구성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기하학 처리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를 해왔다. 특히, 성 교수는 3D 객체 분할, 생성/완성, 그리고 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냈다. 성민혁 교수의 연구는 또한 3D 객체의 변형 가능성을 학습하고 이를 3D 객체 검색 및 편집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최근 성 교수는 3D 생성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그리고 메시(Mesh)와 NeRF/Gaussian Splats 편집 등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에 대한 생성 모델 기법을 확장하고 있다.
성민혁 교수는 SIGGRAPH Asia (2022, 2023), Pacific Graphics (2023), Eurographics (2022, 2024, 2025), ICLR (2025) 등의 주요 학술대회에서 기술 프로그램 위원으로 활동하며, Graphics Models 저널에서는 2022년부터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Asiagraphs Webinar의 워킹 팀에서도 활동 중이다.
성 교수는 이번 아시아그래픽스 젊은 연구자상 수상으로 그동안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기하학 처리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의 미래의 연구 리더로서 기대를 모은다.
2024.11.26 조회수 3175 -
 2025년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 개최
우리 대학이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다.
2024년 1월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되는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게 양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문적인 양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대학 대표 교수진과 더불어 세계적인 양자 기술 권위를 지닌 MIT 교수진 포함 총 8명이 양자 정보 과학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교육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강의에는 핵자기공명(NMR), NV 큐비트, 센싱 전문가인 파올라 카펠라로(Paola Cappellaro), 윌리엄 올리버(William D. Oliver), 최순원(Soonwon Choi), 케빈 오브라이언(Kevin P. O’Brien) 교수 등 MIT 교수진과 라영식, 오창훈, 배준우, 최재윤 교수 등 KAIST 소속 양자 과학 전문 석학들이 함께한다.
동시에 양자 통신·센싱·컴퓨팅·시뮬레이터 등의 대표 분야 실험을 소개하고 현재 양자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대응 방안, 미래 비전 등을 배우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연구 현장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학생들의 양자이론과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은성 양자대학원장은 “2025년 KAIST-MIT 겨울학교는 평소 양자 기술에 열정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되고 추후 미래를 선도하는 양자 과학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대학의 3~4학년 학부생은 11월 22일(금)까지 포스터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구글폼(https://url.kr/3jfrz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자대학원에서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약 4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본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고 우리 대학은 기숙사 및 중식 제공 등 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자대학원 홈페이지(https://quantumschool.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양자대학원(☎042-350-8381, 8382)로 하면 된다.
2024.11.15 조회수 4354
2025년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 개최
우리 대학이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다.
2024년 1월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되는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게 양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문적인 양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대학 대표 교수진과 더불어 세계적인 양자 기술 권위를 지닌 MIT 교수진 포함 총 8명이 양자 정보 과학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교육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강의에는 핵자기공명(NMR), NV 큐비트, 센싱 전문가인 파올라 카펠라로(Paola Cappellaro), 윌리엄 올리버(William D. Oliver), 최순원(Soonwon Choi), 케빈 오브라이언(Kevin P. O’Brien) 교수 등 MIT 교수진과 라영식, 오창훈, 배준우, 최재윤 교수 등 KAIST 소속 양자 과학 전문 석학들이 함께한다.
동시에 양자 통신·센싱·컴퓨팅·시뮬레이터 등의 대표 분야 실험을 소개하고 현재 양자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대응 방안, 미래 비전 등을 배우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연구 현장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학생들의 양자이론과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은성 양자대학원장은 “2025년 KAIST-MIT 겨울학교는 평소 양자 기술에 열정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되고 추후 미래를 선도하는 양자 과학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대학의 3~4학년 학부생은 11월 22일(금)까지 포스터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구글폼(https://url.kr/3jfrz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자대학원에서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약 4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본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고 우리 대학은 기숙사 및 중식 제공 등 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자대학원 홈페이지(https://quantumschool.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양자대학원(☎042-350-8381, 8382)로 하면 된다.
2024.11.15 조회수 4354 -
 이의진 교수, 미국컴퓨터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이 지난 10월 8일 호주 멜버른에서 미국컴퓨터협회(ACM) 주최로 개최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학회(Ubicomp/ISWC)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CM 유비쿼터스 컴퓨팅 학회는 전 세계 유수 대학 및 글로벌 기업들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웨어러블 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학회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유비쿼터스 및 웨어러블 컴퓨팅 분야의 최신 연구를 다루는 ACM 논문집(PACM) IMWUT(Interactive, Mobile, Wearable and Ubiquitous Technologies)에 출판된 논문을 초청해 구성된다.
우수 논문상 선정 위원회는 ACM 논문집인(PACM IMWUT) 학술지 7권에 게재된 205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 커뮤니티에 탁월하고 모범적인 기여를 한 8편의 논문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현직 및 전직 위원 16명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전체 논문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한 달 이상 거쳐 결정된다.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논문은 KAIST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졸업한 박준영 박사가 주저자로 수행한 연구로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의 참여도 저하에 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이의진 교수 연구팀은 건강 관리 앱도 사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상황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에 대한 참여도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활동적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앱인 비액티브(BeActive)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자의 자가통제(Self-Control) 능력과 지루함 성향(Boredom-Proneness)이 적시 중재에 대한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8주간의 실증 실험 결과,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적시 중재를 제공하더라도 참여도 저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통제 능력이 높고 지루함 성향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앱을 통해 전달되는 적시 중재에 순응도가 다른 그룹의 사용자들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특히 지루함 성향이 높은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적시 중재에 싫증을 쉽게 느껴 앱의 순응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빨리 감소했다.
이의진 교수는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를 활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및 웰니스 서비스의 참여도에 관한 첫 연구 결과로 참여도 증진 방법 탐색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및 복합상황인지 기술을 활용해 참여도를 증강하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재원으로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NRF-2021M3A9E4080780) 및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개발사업(NRF-2022R1A2C201153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10.25 조회수 4571
이의진 교수, 미국컴퓨터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이 지난 10월 8일 호주 멜버른에서 미국컴퓨터협회(ACM) 주최로 개최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학회(Ubicomp/ISWC)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CM 유비쿼터스 컴퓨팅 학회는 전 세계 유수 대학 및 글로벌 기업들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웨어러블 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학회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유비쿼터스 및 웨어러블 컴퓨팅 분야의 최신 연구를 다루는 ACM 논문집(PACM) IMWUT(Interactive, Mobile, Wearable and Ubiquitous Technologies)에 출판된 논문을 초청해 구성된다.
우수 논문상 선정 위원회는 ACM 논문집인(PACM IMWUT) 학술지 7권에 게재된 205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 커뮤니티에 탁월하고 모범적인 기여를 한 8편의 논문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현직 및 전직 위원 16명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전체 논문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한 달 이상 거쳐 결정된다.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논문은 KAIST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졸업한 박준영 박사가 주저자로 수행한 연구로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의 참여도 저하에 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이의진 교수 연구팀은 건강 관리 앱도 사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상황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에 대한 참여도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활동적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앱인 비액티브(BeActive)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자의 자가통제(Self-Control) 능력과 지루함 성향(Boredom-Proneness)이 적시 중재에 대한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8주간의 실증 실험 결과,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적시 중재를 제공하더라도 참여도 저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통제 능력이 높고 지루함 성향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앱을 통해 전달되는 적시 중재에 순응도가 다른 그룹의 사용자들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특히 지루함 성향이 높은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적시 중재에 싫증을 쉽게 느껴 앱의 순응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빨리 감소했다.
이의진 교수는 “적시 모바일 건강 중재를 활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및 웰니스 서비스의 참여도에 관한 첫 연구 결과로 참여도 증진 방법 탐색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및 복합상황인지 기술을 활용해 참여도를 증강하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재원으로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NRF-2021M3A9E4080780) 및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개발사업(NRF-2022R1A2C201153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10.25 조회수 4571 -
 양자대학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 초청강연 20일(일), 21일(월) 개최
우리 대학 양자대학원 및 물리학과에서는 오는 20일(일)부터 이틀간 대전 KAIST 본원에서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랭 아스페(Alain Aspect)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강연은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대중의 과학 흥미를 고취하고자 양자대학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알랭 에스파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에서 양자 기술까지’를 주제로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개념과 양자 기술이 미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한다.
20일(일) 강연은 대전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KI빌딩 1층 퓨전홀에서, 이튿날인 21일(월)은 KAIST 전 구성원 대상으로 학술문화관 5층 정근모홀에서 진행한다.
알랭 아스페 교수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의 실재 여부에 대해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한 공로로 2022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양자 얽힘이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서로 얽힌 두 양성자가 최초 상호반응을 하면, 이후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상호반응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미래 슈퍼컴퓨터와 양자 암호 기술의 길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MIT라 불리는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 및 파리-사클레 대학교(Université Paris-Saclay)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은성 KAIST 양자대학원장은“양자 기술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기술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초청강연을 통해 물리학과 양자 연구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우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0일(일) 접수는 마감이며 21일(월) KA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당일 현장접수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대학 양자대학원에서는 앞으로도 양자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및 강연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10.17 조회수 3545
양자대학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 초청강연 20일(일), 21일(월) 개최
우리 대학 양자대학원 및 물리학과에서는 오는 20일(일)부터 이틀간 대전 KAIST 본원에서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랭 아스페(Alain Aspect)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강연은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대중의 과학 흥미를 고취하고자 양자대학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알랭 에스파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에서 양자 기술까지’를 주제로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개념과 양자 기술이 미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한다.
20일(일) 강연은 대전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KI빌딩 1층 퓨전홀에서, 이튿날인 21일(월)은 KAIST 전 구성원 대상으로 학술문화관 5층 정근모홀에서 진행한다.
알랭 아스페 교수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의 실재 여부에 대해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한 공로로 2022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양자 얽힘이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서로 얽힌 두 양성자가 최초 상호반응을 하면, 이후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상호반응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미래 슈퍼컴퓨터와 양자 암호 기술의 길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MIT라 불리는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 및 파리-사클레 대학교(Université Paris-Saclay)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은성 KAIST 양자대학원장은“양자 기술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기술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초청강연을 통해 물리학과 양자 연구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우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0일(일) 접수는 마감이며 21일(월) KA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당일 현장접수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대학 양자대학원에서는 앞으로도 양자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및 강연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10.17 조회수 3545 -
 유민수 교수, 아시아大 최초 MICRO 프로그램 위원장 선임
우리 대학 전기및전자공학부 유민수 교수가 2025년 개최 예정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전산공학회(ACM) 마이크로아키텍처 국제 학술대회(MICRO)의 프로그램 위원장(Program Co-Chair)에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대학 교원이 MICRO의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본 학술대회의 57년 역사상 최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은 MICRO*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로, ISCA** , HPCA*** 학술대회와 함께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3대 국제 학회로 손꼽히고 있다.
* MICRO: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 ISCA: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 HPCA: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전 세계의 관련 분야 학자와 기업인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며 제출된 논문 중 상위 20퍼센트 미만 가량만이 최종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컴퓨터 시스템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
유민수 교수는 2021년 HPCA 학술대회, 2022년 MICRO 학술대회, 2024년 ISCA 학술대회 명예의 전당에 각각 회원으로 추대되었을 정도로 AI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분야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전문가다.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제58회 MICRO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위원장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라듀 테오도레스큐(Radu Teodorescu) 교수와 함께 맡게 된 유민수 교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300여 명의 프로그램 심사위원단(Program Committee)을 직접 선발하고 대회에 제출될 500여 편의 논문 선정 심사를 주관한다.
유민수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엔비디아 리서치(NVIDIA Research)에서 3년간(2014~2017) 근무한 후 2018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 중이며, 메타(Meta) AI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2022-2023).
HPCA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 2024), 구글 학술상(Google Research Scholar Award, 2023), 페이스북 패컬티 리서치 어워드(Facebook Faculty Research Award, 2020),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Y-KAST(학문 성과가 뛰어난 43세 이하 젊은 과학자) 회원(2023)으로 선정됐다.
유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논문만을 선발하는 MICRO 학회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신생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7회 IEEE/ACM MICRO는 올해 11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9.05 조회수 4808
유민수 교수, 아시아大 최초 MICRO 프로그램 위원장 선임
우리 대학 전기및전자공학부 유민수 교수가 2025년 개최 예정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전산공학회(ACM) 마이크로아키텍처 국제 학술대회(MICRO)의 프로그램 위원장(Program Co-Chair)에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대학 교원이 MICRO의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본 학술대회의 57년 역사상 최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은 MICRO*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로, ISCA** , HPCA*** 학술대회와 함께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3대 국제 학회로 손꼽히고 있다.
* MICRO: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 ISCA: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 HPCA: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전 세계의 관련 분야 학자와 기업인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며 제출된 논문 중 상위 20퍼센트 미만 가량만이 최종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컴퓨터 시스템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
유민수 교수는 2021년 HPCA 학술대회, 2022년 MICRO 학술대회, 2024년 ISCA 학술대회 명예의 전당에 각각 회원으로 추대되었을 정도로 AI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분야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전문가다.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제58회 MICRO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위원장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라듀 테오도레스큐(Radu Teodorescu) 교수와 함께 맡게 된 유민수 교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300여 명의 프로그램 심사위원단(Program Committee)을 직접 선발하고 대회에 제출될 500여 편의 논문 선정 심사를 주관한다.
유민수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엔비디아 리서치(NVIDIA Research)에서 3년간(2014~2017) 근무한 후 2018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 중이며, 메타(Meta) AI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2022-2023).
HPCA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 2024), 구글 학술상(Google Research Scholar Award, 2023), 페이스북 패컬티 리서치 어워드(Facebook Faculty Research Award, 2020),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Y-KAST(학문 성과가 뛰어난 43세 이하 젊은 과학자) 회원(2023)으로 선정됐다.
유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논문만을 선발하는 MICRO 학회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신생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7회 IEEE/ACM MICRO는 올해 11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9.05 조회수 4808 -
 윤국진 교수 연구팀, ECCV 2024에 논문 12편 채택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이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인 ECCV 2024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 채택되어,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CVPR, ICCV와 함께 컴퓨터 비전 분야 뿐 아니라 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꼽히는 ECCV는 1990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Google Scholar 기준 H5-색인 206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학 및 컴퓨터과학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전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이다. 이번 ECCV 2024에는 총 8,585개의 논문들이 제출되었고 그 중 2,395개의 논문이 채택되어 약 27.9%의 낮은 채택률을 기록하였다. 단일 연구실에서 12편의 논문이 채택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은 학습 기반의 시각 지능 구현을 연구 논문들로, 가상 시점 합성, 약지도 의미론적 분할, 비디오 품질 개선, 3차원 의미론적 분할, 3차원 객체 인식, 점구름 완성, 이벤트 카메라 기반 낮과 밤 상태 전이, 이벤트 카메라 기반 스테레오 정합, 적대적 공격과 같은 컴퓨터비전 분야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논문들이다. 특히, 양훈민 박사과정과 정종오 박사과정의 논문 “Prompt-Driven Contrastive Learning for Transferable Adversarial Attacks”은 전체 논문 중 상위 2.3%에 해당하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
앞서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올해 6월 개최된 CVPR 2024에도 9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ECCV 2024에도 12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실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며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CCV 2024는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Mico Milan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8.29 조회수 6967
윤국진 교수 연구팀, ECCV 2024에 논문 12편 채택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이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인 ECCV 2024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 채택되어,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CVPR, ICCV와 함께 컴퓨터 비전 분야 뿐 아니라 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꼽히는 ECCV는 1990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Google Scholar 기준 H5-색인 206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학 및 컴퓨터과학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전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이다. 이번 ECCV 2024에는 총 8,585개의 논문들이 제출되었고 그 중 2,395개의 논문이 채택되어 약 27.9%의 낮은 채택률을 기록하였다. 단일 연구실에서 12편의 논문이 채택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 12편은 학습 기반의 시각 지능 구현을 연구 논문들로, 가상 시점 합성, 약지도 의미론적 분할, 비디오 품질 개선, 3차원 의미론적 분할, 3차원 객체 인식, 점구름 완성, 이벤트 카메라 기반 낮과 밤 상태 전이, 이벤트 카메라 기반 스테레오 정합, 적대적 공격과 같은 컴퓨터비전 분야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논문들이다. 특히, 양훈민 박사과정과 정종오 박사과정의 논문 “Prompt-Driven Contrastive Learning for Transferable Adversarial Attacks”은 전체 논문 중 상위 2.3%에 해당하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
앞서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올해 6월 개최된 CVPR 2024에도 9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ECCV 2024에도 12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실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며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CCV 2024는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Mico Milan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8.29 조회수 6967 -
 차세대 새로운 패러다임 동영상 인식기술 개발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로 구축된 기존 비디오 모델보다 8배 낮은 연산량과 4배 낮은 메모리 사용량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추론 속도 또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대비 4배의 매우 빠른 속도를 달성한 동영상 인식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우리 대학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창익 교수 연구팀이 초고효율 동영상 인식 모델 ‘비디오맘바(VideoMamba)’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디오맘바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계산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동영상 인식 모델이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셀프-어텐션(self-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에 의존해 계산 복잡도가 제곱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김창익 교수 연구팀의 비디오맘바는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elective State Space Model, Selective SSM)* 메커니즘을 활용해 선형 복잡도**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디오맘바는 동영상의 시공간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포착해 긴 종속성을 가진 동영상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elective SSM):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시퀀스 데이터의 문맥을 더 잘 이해하는 상태 공간 모델
**선형 복잡도: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계산량이 증가하는 알고리즘 복잡도
김창익 교수 연구팀은 동영상 인식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디오맘바에 1차원 데이터 처리에 국한된 기존 선택적 상태 공간 메커니즘을 3차원 시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한 시공간적 전방 및 후방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patio-temporal forward and backward SSM)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순서가 없는 공간 정보와 순차적인 시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인식 성능을 향상한다. 연구팀은 다양한 동영상 인식 벤치마크에서 비디오맘바의 성능을 검증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비디오맘바는 영상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는 주행 영상을 분석해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행자와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영상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과 전술을 분석해 전략을 개선하고, 훈련 중 피로도나 부상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예방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창익 교수는 “비디오맘바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뛰어난 성능은 우리 생활에서의 다양한 동영상 활용 분야에 큰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진영 석박사통합과정, 김희선 박사과정, 고강욱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 김민범 박사과정이 공동 저자, 그리고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창익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9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컴퓨터 비전 분야 최우수 국제 학회 중 하나인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ECCV) 2024’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명: VideoMamba: Spatio-Temporal Selective State Space Model)
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No. 2020-0-00153, 기계학습 모델 보안 역기능 취약점 자동 탐지 및 방어 기술 개발)
2024.07.23 조회수 5229
차세대 새로운 패러다임 동영상 인식기술 개발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로 구축된 기존 비디오 모델보다 8배 낮은 연산량과 4배 낮은 메모리 사용량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추론 속도 또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대비 4배의 매우 빠른 속도를 달성한 동영상 인식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우리 대학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창익 교수 연구팀이 초고효율 동영상 인식 모델 ‘비디오맘바(VideoMamba)’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디오맘바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계산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동영상 인식 모델이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셀프-어텐션(self-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에 의존해 계산 복잡도가 제곱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김창익 교수 연구팀의 비디오맘바는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elective State Space Model, Selective SSM)* 메커니즘을 활용해 선형 복잡도**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디오맘바는 동영상의 시공간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포착해 긴 종속성을 가진 동영상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elective SSM):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시퀀스 데이터의 문맥을 더 잘 이해하는 상태 공간 모델
**선형 복잡도: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계산량이 증가하는 알고리즘 복잡도
김창익 교수 연구팀은 동영상 인식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디오맘바에 1차원 데이터 처리에 국한된 기존 선택적 상태 공간 메커니즘을 3차원 시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한 시공간적 전방 및 후방 선택적 상태 공간 모델(spatio-temporal forward and backward SSM)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순서가 없는 공간 정보와 순차적인 시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인식 성능을 향상한다. 연구팀은 다양한 동영상 인식 벤치마크에서 비디오맘바의 성능을 검증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비디오맘바는 영상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는 주행 영상을 분석해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행자와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영상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과 전술을 분석해 전략을 개선하고, 훈련 중 피로도나 부상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예방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창익 교수는 “비디오맘바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뛰어난 성능은 우리 생활에서의 다양한 동영상 활용 분야에 큰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진영 석박사통합과정, 김희선 박사과정, 고강욱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 김민범 박사과정이 공동 저자, 그리고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창익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9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컴퓨터 비전 분야 최우수 국제 학회 중 하나인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ECCV) 2024’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명: VideoMamba: Spatio-Temporal Selective State Space Model)
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No. 2020-0-00153, 기계학습 모델 보안 역기능 취약점 자동 탐지 및 방어 기술 개발)
2024.07.23 조회수 5229 -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 CVPR 2024에 9편 논문 발표하며 세계적 성과 달성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이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국제학술대회인 CVPR 2024(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4)에서 구두 발표 논문 1편과 하이라이트 논문 1편을 비롯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1983년부터 개최된 CVPR 학술대회는 매년 열리는 컴퓨터비전과 패턴인식 분야의 최고 권위의 학술 대회로, 구글 Scholar에 따르면 CVPR은 H5-색인 422를 기록하여 공학 및 컴퓨터과학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전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학술대회이다.
CVPR 2024는 지난 2024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11,53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총 2,719편의 논문이 채택되어 23.6%의 채택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324편의 논문은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되어 2.81%의 채택율을 기록하였고, 90편의 논문은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0.78%의 채택율을 기록할 정도로 낮은 채택율을 기록하였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비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3차원 객체인식, 인체 자세 예측, 비디오 품질 개선, 다중 작업 최적화, 에이전트 경로 예측, 약지도 의미론적 분할 등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 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는 물론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발표된 논문들 중 권혁준 박사과정의 논문은 전체 논문 중 상위 0.78%에 해당하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재우 박사과정과 박대희 박사과정의 논문은전체 논문 중 상위 2.81%에 해당하는 하이라이트 논문 선정되어,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매우 높은 학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단일 연구실에서 다수의 논문이 동일 학회에 채택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주목 받았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인공지능과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향후 유사한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학문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뤄가며, 학계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2024.07.04 조회수 5020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 CVPR 2024에 9편 논문 발표하며 세계적 성과 달성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윤국진 교수 연구팀이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국제학술대회인 CVPR 2024(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4)에서 구두 발표 논문 1편과 하이라이트 논문 1편을 비롯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1983년부터 개최된 CVPR 학술대회는 매년 열리는 컴퓨터비전과 패턴인식 분야의 최고 권위의 학술 대회로, 구글 Scholar에 따르면 CVPR은 H5-색인 422를 기록하여 공학 및 컴퓨터과학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전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학술대회이다.
CVPR 2024는 지난 2024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11,53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총 2,719편의 논문이 채택되어 23.6%의 채택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324편의 논문은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되어 2.81%의 채택율을 기록하였고, 90편의 논문은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0.78%의 채택율을 기록할 정도로 낮은 채택율을 기록하였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비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3차원 객체인식, 인체 자세 예측, 비디오 품질 개선, 다중 작업 최적화, 에이전트 경로 예측, 약지도 의미론적 분할 등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 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는 물론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발표된 논문들 중 권혁준 박사과정의 논문은 전체 논문 중 상위 0.78%에 해당하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재우 박사과정과 박대희 박사과정의 논문은전체 논문 중 상위 2.81%에 해당하는 하이라이트 논문 선정되어,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매우 높은 학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단일 연구실에서 다수의 논문이 동일 학회에 채택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주목 받았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인공지능과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향후 유사한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학문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국진 교수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뤄가며, 학계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2024.07.04 조회수 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