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B0%94%EC%9D%B4%EC%98%A4
-
 가상세포를 이용한 병원균의 약물표적 예측기술 개발
- 가상세포 시스템 활용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큰 파급효과 기대
- 분자 바이오시스템(Molecular BioSystems)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李相燁, 46세, LG화학 석좌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특훈교수팀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병원성 미생물의 가상세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병원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 표적을 예측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김현욱(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연구원의 학위 논문연구로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화학 관련 학술단체 RSC(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발간하는 분자 바이오시스템(Molecular BioSystems)지의 2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예전에는 병원성 세균들을 항생제로 쉽게 치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병원균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됐으며, 따라서 한 번 감염이 되면 치유가 이전보다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병원균이 바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aii)다. 본래 흙이나 물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미생물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지 않아 치료가 쉽고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는 균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로 변했으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다수의 미군과 프랑스군도 이 균에 감염되면서 상처가 낫질 않아 많은 희생을 야기했다.
李 교수 연구팀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게놈과 전체적인 대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산재해 있는 생물정보와 문헌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분석, 디자인하여 가상세포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 필수 대사반응 및 대사산물 분석 등 융합 방법론을 이용해 이 병원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물표적을 예측했다.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병원균에게만 작용하는 최종 약물표적들이다.
필수 대사반응은 생명체가 대사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효소반응을 말하며, 필수 대사산물이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대사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로서 이들을 제거할 경우 이와 반응을 하는 효소들을 모두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 약물표적은 가상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대사 유전자, 효소 반응, 신진대사들의 기능을 짧은 시간 안에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검토해 예측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필수 대사물질의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 효과적인 약물표적을 찾고, 나아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병원균에 의한 감염 현상과 신약개발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李 교수는 “현재 수많은 생물의 게놈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의 게놈 정보로부터 의학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정보를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 병원균의 가상세포 개발은 특정 환경에서 필수 유전자나 효소 반응에 대한 대량의 새로운 생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李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스템 생물학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병원성 균주의 가상세포 개발 및 항생제 약물표적 예측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 용어설명 ○ 약물표적 : 차단 시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단백질 효소 및 그와 관련된 화학물질
▣ (자료1) 가상세포.
(자료2) 가상세포로부터 필수대사산물을 예측한 후에, 병원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물표적만을 추리는 과정
2010.02.18 조회수 15318
가상세포를 이용한 병원균의 약물표적 예측기술 개발
- 가상세포 시스템 활용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큰 파급효과 기대
- 분자 바이오시스템(Molecular BioSystems)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李相燁, 46세, LG화학 석좌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특훈교수팀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병원성 미생물의 가상세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병원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 표적을 예측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김현욱(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연구원의 학위 논문연구로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화학 관련 학술단체 RSC(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발간하는 분자 바이오시스템(Molecular BioSystems)지의 2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예전에는 병원성 세균들을 항생제로 쉽게 치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병원균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됐으며, 따라서 한 번 감염이 되면 치유가 이전보다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병원균이 바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aii)다. 본래 흙이나 물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미생물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지 않아 치료가 쉽고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는 균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로 변했으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다수의 미군과 프랑스군도 이 균에 감염되면서 상처가 낫질 않아 많은 희생을 야기했다.
李 교수 연구팀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게놈과 전체적인 대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산재해 있는 생물정보와 문헌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분석, 디자인하여 가상세포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 필수 대사반응 및 대사산물 분석 등 융합 방법론을 이용해 이 병원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물표적을 예측했다.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병원균에게만 작용하는 최종 약물표적들이다.
필수 대사반응은 생명체가 대사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효소반응을 말하며, 필수 대사산물이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대사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로서 이들을 제거할 경우 이와 반응을 하는 효소들을 모두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 약물표적은 가상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대사 유전자, 효소 반응, 신진대사들의 기능을 짧은 시간 안에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검토해 예측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필수 대사물질의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 효과적인 약물표적을 찾고, 나아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병원균에 의한 감염 현상과 신약개발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李 교수는 “현재 수많은 생물의 게놈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의 게놈 정보로부터 의학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정보를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 병원균의 가상세포 개발은 특정 환경에서 필수 유전자나 효소 반응에 대한 대량의 새로운 생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李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스템 생물학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병원성 균주의 가상세포 개발 및 항생제 약물표적 예측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 용어설명 ○ 약물표적 : 차단 시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단백질 효소 및 그와 관련된 화학물질
▣ (자료1) 가상세포.
(자료2) 가상세포로부터 필수대사산물을 예측한 후에, 병원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물표적만을 추리는 과정
2010.02.18 조회수 15318 -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교수, 생명공학분야 국제학술지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편집자로 위촉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교수가 유럽 최대 규모의 출판사인 독일 와일리(Wiley-VCH)社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 편집자(Editorial Board Member)로 최근 선임됐다.
박 교수는 그간 DNA 칩(chip)과 핵산 분석 바이오센서(Biosensor) 등 DNA 생명공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많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 왔다. 박 교수는 2012년까지 이 저널의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은 지난 2006년 1월에 창간됐으며 Systems & Synthetic Biology, Nanobiotechnology, Microarray Technology, Metabolic Engineering 등의 생명공학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국제 생명공학 학술지이다.
2010.02.08 조회수 16416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교수, 생명공학분야 국제학술지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편집자로 위촉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교수가 유럽 최대 규모의 출판사인 독일 와일리(Wiley-VCH)社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 편집자(Editorial Board Member)로 최근 선임됐다.
박 교수는 그간 DNA 칩(chip)과 핵산 분석 바이오센서(Biosensor) 등 DNA 생명공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많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 왔다. 박 교수는 2012년까지 이 저널의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생명공학저널(Biotechnology Journal)은 지난 2006년 1월에 창간됐으며 Systems & Synthetic Biology, Nanobiotechnology, Microarray Technology, Metabolic Engineering 등의 생명공학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국제 생명공학 학술지이다.
2010.02.08 조회수 16416 -
 대전시와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 설립 협약체결
우리학교는 지난 2월 1일(월)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미래 질병연구를 선도할 기본인프라 시설인 ‘대전 질환모델동물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공동협약을 대전광역시와 체결했다.
대전시 박성효 시장, 우리학교 서남표 총장을 비롯해서 바이오기업 대표, 정부출연연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설립될 ‘대전 질환모델동물센터’는 KAIST 내 1,40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총 45억원(대전광역시 20억원, KAIST 2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의료R&D에 필수적인 전임상 연구 및 실험동물 공급을 위한 기본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첨단의료R&D에 필수적인 전임상 연구 및 실험동물 공급을 위한 기본인프라 설치로 대전의 의료산업 기반구축과 첨단의료산업 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센터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등이 협약 주요골자이다.
대전시는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내 대학, 정부출연연, 바이오기업의 연구자들에게 질환모델동물 공급 및 기술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첨단의료R&D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질환모델 동물 및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대전지역 바이오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질환모델동물 수요급증에 대응한 세계적인 의료연구 중심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미래 질병연구를 선도할 ‘질환모델동물센터’ 설립을 통해 대전지역의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과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앞으로도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시와 KAIST는 지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질환모델동물 생산 및 연구능력을 극대화 하여, 대전지역 바이오연구 활성화에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02.01 조회수 13486
대전시와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 설립 협약체결
우리학교는 지난 2월 1일(월)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미래 질병연구를 선도할 기본인프라 시설인 ‘대전 질환모델동물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공동협약을 대전광역시와 체결했다.
대전시 박성효 시장, 우리학교 서남표 총장을 비롯해서 바이오기업 대표, 정부출연연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설립될 ‘대전 질환모델동물센터’는 KAIST 내 1,40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총 45억원(대전광역시 20억원, KAIST 2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의료R&D에 필수적인 전임상 연구 및 실험동물 공급을 위한 기본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첨단의료R&D에 필수적인 전임상 연구 및 실험동물 공급을 위한 기본인프라 설치로 대전의 의료산업 기반구축과 첨단의료산업 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센터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등이 협약 주요골자이다.
대전시는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내 대학, 정부출연연, 바이오기업의 연구자들에게 질환모델동물 공급 및 기술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첨단의료R&D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질환모델 동물 및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대전지역 바이오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질환모델동물 수요급증에 대응한 세계적인 의료연구 중심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미래 질병연구를 선도할 ‘질환모델동물센터’ 설립을 통해 대전지역의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과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앞으로도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시와 KAIST는 지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질환모델동물 생산 및 연구능력을 극대화 하여, 대전지역 바이오연구 활성화에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02.01 조회수 13486 -
 생명화공 장호남 교수,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성공
- 페자원을 활용한 국내 녹색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 -
생명화학공학과 장호남교수팀이 포도당 기반 공법과 휘발성 유기산 공법을 이용해 유기성 폐자원 및 해조류에서 연료용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포도당 기반 공법의 연구결과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비식용 바이오메스 동시 당화 발효(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of lignocellulosic residues pretreated with phosphoric acid–acetone for bioethanol production)’ 라는 제목으로 생물자원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생물자원기술(Bioresource Technology)에 지난 7월 게재됐다.
이 연구결과로 장교수팀은 포도당 기반 공법을 이용해 갈대로부터 56g/L, 잔디에서 50g/L, 유채줄기에서 20g/L의 에탄올을 얻었다. 특히 갈대를 이용한 유가배양연구에서는 69g/L을 얻었다.
이 연구를 응용하여 지금까지 에탄올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시마(갈조류)에서 29g/L의 에탄올을 생산했다. 이 기술은 지난 9월 특허로 등록됐다.
또한, 포도당 기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고효율의 휘발성 유기산공법 (Volatile Fatty Acid, VFA공법)을 통해 국내 유기성 폐자원(음식물쓰레기, 해조류 쓰레기)을 건조 폐기물 톤당 약 500L의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놨다.
VFA공법은 포도당 기반 공법의 효소처리 비용을 자연발효를 통해 없앴고 바이오메스 일부가 아닌 전체를 발효시켜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장교수는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은 값이 싸서 제품의 원가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아 경제성이 있으며 폐기물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양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해양투기, 매립 등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400만톤(건조 중량 80만톤)의 50%를 VFA공법으로 처리하면 연산 10만톤 공장2기에서 연간 20만톤 규모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의 녹색에너지 자립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장교수는 최근 국내특허(국제특허 출원중)를 취득한 MSC-HCDC (다단계 고농도 세포배양)공법을 활용하여 VFA 생산 및 정제, 수소첨가 반응연구를 수행하여 최근 실험실 규모의 연료용 알코올 생산에 성공했다.
현재 2010년 약 1톤 정도의 연료용 알코올 파이로트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건의 관련 특허도 출원 중에 있다.
※ 용어설명 :
○포도당 기반 공법: 셀루로즈를 당화효소로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든 후 이를 효모로 알콜 발효하는 공법이다. 바이오매스 톤당 최고 300-L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FA 공법: 지구상의 모든 바이오매스는 혐기성 자연상태에서 초산, 프로피온산, 부칠산의 휘발산 유기산으로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메탄가스와 탄산가스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VFA-공법은 메탄가스로 가는 공정을 막고 이를 연료용 알코올 및 각종 화합물로 보내는 공법으로 에탄올 생산량은 유기물 톤당 500-L에 달한다.
2009.12.09 조회수 14976
생명화공 장호남 교수,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성공
- 페자원을 활용한 국내 녹색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 -
생명화학공학과 장호남교수팀이 포도당 기반 공법과 휘발성 유기산 공법을 이용해 유기성 폐자원 및 해조류에서 연료용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포도당 기반 공법의 연구결과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비식용 바이오메스 동시 당화 발효(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of lignocellulosic residues pretreated with phosphoric acid–acetone for bioethanol production)’ 라는 제목으로 생물자원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생물자원기술(Bioresource Technology)에 지난 7월 게재됐다.
이 연구결과로 장교수팀은 포도당 기반 공법을 이용해 갈대로부터 56g/L, 잔디에서 50g/L, 유채줄기에서 20g/L의 에탄올을 얻었다. 특히 갈대를 이용한 유가배양연구에서는 69g/L을 얻었다.
이 연구를 응용하여 지금까지 에탄올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시마(갈조류)에서 29g/L의 에탄올을 생산했다. 이 기술은 지난 9월 특허로 등록됐다.
또한, 포도당 기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고효율의 휘발성 유기산공법 (Volatile Fatty Acid, VFA공법)을 통해 국내 유기성 폐자원(음식물쓰레기, 해조류 쓰레기)을 건조 폐기물 톤당 약 500L의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놨다.
VFA공법은 포도당 기반 공법의 효소처리 비용을 자연발효를 통해 없앴고 바이오메스 일부가 아닌 전체를 발효시켜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장교수는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은 값이 싸서 제품의 원가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아 경제성이 있으며 폐기물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양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해양투기, 매립 등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400만톤(건조 중량 80만톤)의 50%를 VFA공법으로 처리하면 연산 10만톤 공장2기에서 연간 20만톤 규모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의 녹색에너지 자립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장교수는 최근 국내특허(국제특허 출원중)를 취득한 MSC-HCDC (다단계 고농도 세포배양)공법을 활용하여 VFA 생산 및 정제, 수소첨가 반응연구를 수행하여 최근 실험실 규모의 연료용 알코올 생산에 성공했다.
현재 2010년 약 1톤 정도의 연료용 알코올 파이로트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건의 관련 특허도 출원 중에 있다.
※ 용어설명 :
○포도당 기반 공법: 셀루로즈를 당화효소로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든 후 이를 효모로 알콜 발효하는 공법이다. 바이오매스 톤당 최고 300-L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FA 공법: 지구상의 모든 바이오매스는 혐기성 자연상태에서 초산, 프로피온산, 부칠산의 휘발산 유기산으로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메탄가스와 탄산가스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VFA-공법은 메탄가스로 가는 공정을 막고 이를 연료용 알코올 및 각종 화합물로 보내는 공법으로 에탄올 생산량은 유기물 톤당 500-L에 달한다.
2009.12.09 조회수 14976 -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 전자신문에 소개돼
전자신문이 특집연재 중인 [新 지방시대, R&D 허브를 꿈꾼다] 제 24편으로 우리학교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SDIA, 소장 유회준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가 소개됐다. 기사는 전자신문 2009년 12월 2일 수요일자 19면의 약 3분의 2면을 할애하여 연구센터 소개와 유회준 소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스디아(SDIA,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는 인간중심의 시스템 디자인을 앞세어 국내 지능형 시스템온칩(SoC) 로봇과 웨어러블 컴퓨터,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관련기술을 선도하는 유망한 연구집단이다. 유회준 소장은 인터뷰에서 "로봇 워 행사를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는 등의 소감을 밝혔다.
연재: [新 지방시대, R&D 허브를 꿈꾼다] 24. KAIST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
제목: "인간중심의 미래형 IT 新문화 디자인"
부제: 지능형 로봇, 입는 컴퓨터 등 관련기술 선도, 다양한 대학-기업과 탄탄한 네트워크 유지
매체: 전자신문 19면(NewsPLUS면)
취재: 박희범 대덕특구 출입기자
일시: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관련기사1. 연구센터 소개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10079
관련기사2. 유회준 소장 인터뷰 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10080
2009.12.02 조회수 12494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 전자신문에 소개돼
전자신문이 특집연재 중인 [新 지방시대, R&D 허브를 꿈꾼다] 제 24편으로 우리학교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SDIA, 소장 유회준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가 소개됐다. 기사는 전자신문 2009년 12월 2일 수요일자 19면의 약 3분의 2면을 할애하여 연구센터 소개와 유회준 소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스디아(SDIA,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는 인간중심의 시스템 디자인을 앞세어 국내 지능형 시스템온칩(SoC) 로봇과 웨어러블 컴퓨터,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관련기술을 선도하는 유망한 연구집단이다. 유회준 소장은 인터뷰에서 "로봇 워 행사를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는 등의 소감을 밝혔다.
연재: [新 지방시대, R&D 허브를 꿈꾼다] 24. KAIST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
제목: "인간중심의 미래형 IT 新문화 디자인"
부제: 지능형 로봇, 입는 컴퓨터 등 관련기술 선도, 다양한 대학-기업과 탄탄한 네트워크 유지
매체: 전자신문 19면(NewsPLUS면)
취재: 박희범 대덕특구 출입기자
일시: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관련기사1. 연구센터 소개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10079
관련기사2. 유회준 소장 인터뷰 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10080
2009.12.02 조회수 12494 -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박테리아로 범용 플라스틱 생산기술 개발
- 이상엽 교수팀과 LG 화학 연구팀 공동개발
-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지 게재예정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李相燁, 45세, LG화학 석좌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특훈교수팀과 LG화학 기술연구원(원장 유진녕) 박시재, 양택호박사팀이 4년여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스템생물학 연구개발 사업과 LG화학 석좌교수 연구비로 지원된 이번 연구에서는 시스템 대사공학과 효소공학 기법을 접목, 자연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플라스틱(unnatural polymer)의 일종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폴리유산(Polylactic acid, PLA)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공학 분야 최고 전통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지에 게재 승인됐으며 스포트라이트 논문(Spotlight paper)으로 선정돼 2010년 1월호에 두 편의 연속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두 논문의 제목은 ‘개량된 프로피오네이트 코엔자임 에이 트랜스퍼레이즈와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중합효소를 이용한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의 생합성(Biosynthesis of Polylactic acid and its Copolymers Using Evolved Propionate CoA Transferase and PHA Synthase)’과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의 생산을 위한 대장균의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for the Production of Polylactic Acid and its Copolymers)’이다. 19건의 특허가 전 세계 출원 중이다.
기존의 복잡한 2단계 공정을 통해 생산되던 폴리유산을 재생가능한 원료로부터 미생물의 직접 발효에 의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인 본 연구 전략은 앞으로 석유 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연 고분자(unnatural polymer)들의 생산에 활용될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폴리유산 (Polylactic acid, PLA)은 많은 바이오매스 유래 고분자들 중에서도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낮은 독성과 같은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대체물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폴리유산은 현재 두 단계 공정으로 합성된다. 우선, 미생물 발효를 통해 유산(락트산, Lactic acid)을 생산, 정제한 후 여러 가지 시약, 용매 및 촉매가 첨가되는 복잡한 공정의 화학적 중합반응에 의해 폴리유산이 합성된다.
또한, 폴리유산의 물성을 다양하게 개선하기 위해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Polyhydroxyalkanoate, PHA)와 같은 다른 고분자들과의 공중합이나 혼합반응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합 반응에 사용되는 락톤계 모노머들의 가용성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화학적 합성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미생물 유래 고분자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의 생합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들의 생합성이 가능할 수 있는 대사경로를 효소공학을 통해 구축했다.
그러나, 외래 대사경로의 도입 및 조작만으로는 폴리유산 단일 중합체와 유산의 함량이 높은 공중합체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않아, 시스템 수준으로 세포 내 대사흐름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대장균 균주의 인실리코 게놈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사흐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고분자 생산을 위한 주요 전구체의 대사 흐름을 논리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세포성장과 함께 목적 고분자의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효소공학을 통한 고분자 합성 경로의 직접적 조작 및 강화 뿐 아니라, 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한 논리적 접근으로 조작된 대사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폴리유산 플라스틱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이는 시스템 대사공학과 효소공학을 접목시킨 고기술 전략으로 비자연 고분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한 최초의 성공적인 예로서,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폴리유산뿐 아니라 석유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자연 고분자들의 일단계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마련해줌으로써, 플라스틱 생산 공정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李 교수는 “자연계에 없는 고분자를 미생물로 생산하는 것이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우리 KAIST 연구실의 정유경박사와 LG화학 기술연구원 연구팀원 10여명이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공했다”며, “이번 연구는 대장균의 가상세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포 내 대사흐름을 목적한 고분자 생산에 유리하도록 논리적으로 조작하고, 고분자 생합성 경로를 구성하는 외래 효소들을 새롭게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강화된 대사흐름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세계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유산이 단량체로 함유된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세계최초로 만든 것이 되어 물질특허들로 출원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22일 미국 CNN 홈페이지의 Top기사 등 해외언론의 주요기사로 소개됐다. 주요내용은 한국의 KAIST 이상엽 교수팀과 LG화학 연구팀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고갈,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로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기반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바이오공학을 통한 플라스틱 (Bioengineered plastics) 폴리유산의 생산이 가능한 대장균 균주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2009.11.24 조회수 20122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박테리아로 범용 플라스틱 생산기술 개발
- 이상엽 교수팀과 LG 화학 연구팀 공동개발
-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지 게재예정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李相燁, 45세, LG화학 석좌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특훈교수팀과 LG화학 기술연구원(원장 유진녕) 박시재, 양택호박사팀이 4년여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스템생물학 연구개발 사업과 LG화학 석좌교수 연구비로 지원된 이번 연구에서는 시스템 대사공학과 효소공학 기법을 접목, 자연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플라스틱(unnatural polymer)의 일종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폴리유산(Polylactic acid, PLA)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공학 분야 최고 전통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지에 게재 승인됐으며 스포트라이트 논문(Spotlight paper)으로 선정돼 2010년 1월호에 두 편의 연속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두 논문의 제목은 ‘개량된 프로피오네이트 코엔자임 에이 트랜스퍼레이즈와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중합효소를 이용한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의 생합성(Biosynthesis of Polylactic acid and its Copolymers Using Evolved Propionate CoA Transferase and PHA Synthase)’과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의 생산을 위한 대장균의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for the Production of Polylactic Acid and its Copolymers)’이다. 19건의 특허가 전 세계 출원 중이다.
기존의 복잡한 2단계 공정을 통해 생산되던 폴리유산을 재생가능한 원료로부터 미생물의 직접 발효에 의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인 본 연구 전략은 앞으로 석유 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연 고분자(unnatural polymer)들의 생산에 활용될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폴리유산 (Polylactic acid, PLA)은 많은 바이오매스 유래 고분자들 중에서도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낮은 독성과 같은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대체물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폴리유산은 현재 두 단계 공정으로 합성된다. 우선, 미생물 발효를 통해 유산(락트산, Lactic acid)을 생산, 정제한 후 여러 가지 시약, 용매 및 촉매가 첨가되는 복잡한 공정의 화학적 중합반응에 의해 폴리유산이 합성된다.
또한, 폴리유산의 물성을 다양하게 개선하기 위해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Polyhydroxyalkanoate, PHA)와 같은 다른 고분자들과의 공중합이나 혼합반응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합 반응에 사용되는 락톤계 모노머들의 가용성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화학적 합성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미생물 유래 고분자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의 생합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폴리유산과 그의 공중합체들의 생합성이 가능할 수 있는 대사경로를 효소공학을 통해 구축했다.
그러나, 외래 대사경로의 도입 및 조작만으로는 폴리유산 단일 중합체와 유산의 함량이 높은 공중합체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않아, 시스템 수준으로 세포 내 대사흐름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대장균 균주의 인실리코 게놈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사흐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고분자 생산을 위한 주요 전구체의 대사 흐름을 논리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세포성장과 함께 목적 고분자의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효소공학을 통한 고분자 합성 경로의 직접적 조작 및 강화 뿐 아니라, 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한 논리적 접근으로 조작된 대사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폴리유산 플라스틱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이는 시스템 대사공학과 효소공학을 접목시킨 고기술 전략으로 비자연 고분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한 최초의 성공적인 예로서,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폴리유산뿐 아니라 석유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자연 고분자들의 일단계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마련해줌으로써, 플라스틱 생산 공정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李 교수는 “자연계에 없는 고분자를 미생물로 생산하는 것이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우리 KAIST 연구실의 정유경박사와 LG화학 기술연구원 연구팀원 10여명이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공했다”며, “이번 연구는 대장균의 가상세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포 내 대사흐름을 목적한 고분자 생산에 유리하도록 논리적으로 조작하고, 고분자 생합성 경로를 구성하는 외래 효소들을 새롭게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강화된 대사흐름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세계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유산이 단량체로 함유된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세계최초로 만든 것이 되어 물질특허들로 출원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22일 미국 CNN 홈페이지의 Top기사 등 해외언론의 주요기사로 소개됐다. 주요내용은 한국의 KAIST 이상엽 교수팀과 LG화학 연구팀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고갈,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로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기반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바이오공학을 통한 플라스틱 (Bioengineered plastics) 폴리유산의 생산이 가능한 대장균 균주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2009.11.24 조회수 20122 -
 바이오및뇌공학과 황현두 군, μTAS 2009 국제학회에서 젊은 연구자 포스터 우수상 수상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과정 황현두(지도교수 박제균) 학생이 지난 11/1-5일 제주도에서 열린 ‘μTAS 2009 국제학회 (제13회 극소형 생물/화학분석시스템 국제학술회의,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aturized Systems for Chemistry and Life Sciences)’에서 ‘광전자유체제어 기술로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생체분자의 확산계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Diffusion measurement of biomolecules using rapid generation of black hole in a molecular solution by optoelectrofluidics)’에 관한 논문으로 ‘젊은 연구자 포스터 우수상(Young Researcher Poster Award Winner)’을 수상했다.
황씨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발표된 약 600 여 편의 Poster 논문 가운데 다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3명의 수상자 중의 한명으로 결정됐다.
황씨는 지난해 San Diego에서 개최된 μTAS 2008 국제학회에서도 여행경비 일부를 보조 받는 ‘Student Travel Grant’를 받은 바 있었다.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3년만에 조기 졸업 한 황씨는 1년 6개월만에 석사논문을 완성하고, 지난 2007년 9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그동안 2년여에 걸친 박사과정 기간 동안 Analytical Chemistry, Langmuir, Lab on a Chip, Applied Physics Letters 등 우수국제 저널에 제1저자의 논문 10편을 이미 출판한 바 있다.
이 중 광전자유체제어기술로 미세입자를 조절하는 새로운 결과는 2009년 1월호 Lab on a Chip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어 논문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바 있었다. 이밖에 황씨는 2007년도 한국바이오칩학회 우수논문발표상, 2008년 서암학술장학재단 제17기 국내 박사과정연구지원 이공계 부문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9.11.12 조회수 20198
바이오및뇌공학과 황현두 군, μTAS 2009 국제학회에서 젊은 연구자 포스터 우수상 수상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과정 황현두(지도교수 박제균) 학생이 지난 11/1-5일 제주도에서 열린 ‘μTAS 2009 국제학회 (제13회 극소형 생물/화학분석시스템 국제학술회의,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aturized Systems for Chemistry and Life Sciences)’에서 ‘광전자유체제어 기술로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생체분자의 확산계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Diffusion measurement of biomolecules using rapid generation of black hole in a molecular solution by optoelectrofluidics)’에 관한 논문으로 ‘젊은 연구자 포스터 우수상(Young Researcher Poster Award Winner)’을 수상했다.
황씨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발표된 약 600 여 편의 Poster 논문 가운데 다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3명의 수상자 중의 한명으로 결정됐다.
황씨는 지난해 San Diego에서 개최된 μTAS 2008 국제학회에서도 여행경비 일부를 보조 받는 ‘Student Travel Grant’를 받은 바 있었다.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3년만에 조기 졸업 한 황씨는 1년 6개월만에 석사논문을 완성하고, 지난 2007년 9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그동안 2년여에 걸친 박사과정 기간 동안 Analytical Chemistry, Langmuir, Lab on a Chip, Applied Physics Letters 등 우수국제 저널에 제1저자의 논문 10편을 이미 출판한 바 있다.
이 중 광전자유체제어기술로 미세입자를 조절하는 새로운 결과는 2009년 1월호 Lab on a Chip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어 논문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바 있었다. 이밖에 황씨는 2007년도 한국바이오칩학회 우수논문발표상, 2008년 서암학술장학재단 제17기 국내 박사과정연구지원 이공계 부문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9.11.12 조회수 201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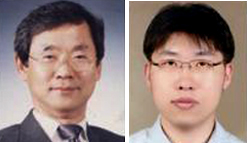 우성일교수 연구팀, 친환경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이용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10월 14일 앙게반테 케미 자매지, "켐서스켐(ChemSusChem)" 온라인판에 게재
생명화학공학과 우성일(58)교수 연구팀은 바이오디젤(bio-diesel)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연료로 이용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구동기술을 개발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우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글리세롤을 연료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를 조업하여 발전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석탄 및 석유에 비해 각각 40%, 26% 가까이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석탄 및 석유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1kWh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각각 991g, 782g이다. 반면 글리세롤은 585g이다. 또한 기존 수소를 연료로 이용했을 때의 80%에 달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연구에 사용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은 글리세롤 개질과정의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재사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14일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의 자매지인 "켐서스켐(ChemSusChem)"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관련기술은 국내특허 출원중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때 얻어진 글리세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 생산에 재사용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에너지 효율이 ~50%에 달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연료전지이다. 연료로 쓰이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탄화수소를 개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바이오디젤은 브라질, 미국, EU등을 중심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이 후발국으로 참여하여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09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7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4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리세롤은 바이오디젤 1 톤을 생산할 때 0.1 톤 정도 부산물로 생산되는 물질로서 바이오디젤의 공급증가에 따른 잉여의 글리세롤이 생성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잉여의 글리세롤을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탄소 녹색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하고 이를 국가나 기업별로 할당하는 제도로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려는 국가나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한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2.2 톤의 배출량을 감면받게 되므로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조업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초미세화학공정연구센터(ERC), 에너지, 환경,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EEWS) 및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지원을 받아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원정연(元正淵)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켐서스켐(ChemSusChem) Paper Link :
http://www3.interscience.wiley.com/journal/114278546/home
2009.10.27 조회수 20235
우성일교수 연구팀, 친환경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이용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10월 14일 앙게반테 케미 자매지, "켐서스켐(ChemSusChem)" 온라인판에 게재
생명화학공학과 우성일(58)교수 연구팀은 바이오디젤(bio-diesel)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연료로 이용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구동기술을 개발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우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글리세롤을 연료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를 조업하여 발전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석탄 및 석유에 비해 각각 40%, 26% 가까이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석탄 및 석유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1kWh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각각 991g, 782g이다. 반면 글리세롤은 585g이다. 또한 기존 수소를 연료로 이용했을 때의 80%에 달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연구에 사용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은 글리세롤 개질과정의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재사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14일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의 자매지인 "켐서스켐(ChemSusChem)"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관련기술은 국내특허 출원중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때 얻어진 글리세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 생산에 재사용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에너지 효율이 ~50%에 달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연료전지이다. 연료로 쓰이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탄화수소를 개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바이오디젤은 브라질, 미국, EU등을 중심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이 후발국으로 참여하여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09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7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4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리세롤은 바이오디젤 1 톤을 생산할 때 0.1 톤 정도 부산물로 생산되는 물질로서 바이오디젤의 공급증가에 따른 잉여의 글리세롤이 생성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잉여의 글리세롤을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탄소 녹색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하고 이를 국가나 기업별로 할당하는 제도로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려는 국가나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한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2.2 톤의 배출량을 감면받게 되므로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조업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초미세화학공정연구센터(ERC), 에너지, 환경,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EEWS) 및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지원을 받아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원정연(元正淵)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켐서스켐(ChemSusChem) Paper Link :
http://www3.interscience.wiley.com/journal/114278546/home
2009.10.27 조회수 20235 -
 생명화공과 양승만 교수 경암학술상 수상
우리학교 생명화학공학과의 양승만 교수가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학술상 공학부문에 선정됐다. 경암재단은 부산 향토기업인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이 사재 1천억원을 털어 2004년 설립한 재단이다. 호암상, 청암상, 인촌상에 이어 국내 최대주순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5회 경암학술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우리학교 생명화학공학과의 양승만 교수가 공학부문에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인문.사회부문 김경만 교수, 자연과학 부문 노태원 서울대 교수, 생명과학 부문 김영준 연세대 교수, 예술 부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등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6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교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양자점, 반도체, 전이금속, 합성수지로 구성된 콜로이드 제조와 분산계의 제어 및 자기조립을 유도하는 콜로이드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광 바이오 기능성 광자결정 구조체를 개발해 상을 수상하게 됐다.
2009.09.22 조회수 15017
생명화공과 양승만 교수 경암학술상 수상
우리학교 생명화학공학과의 양승만 교수가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학술상 공학부문에 선정됐다. 경암재단은 부산 향토기업인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이 사재 1천억원을 털어 2004년 설립한 재단이다. 호암상, 청암상, 인촌상에 이어 국내 최대주순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5회 경암학술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우리학교 생명화학공학과의 양승만 교수가 공학부문에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인문.사회부문 김경만 교수, 자연과학 부문 노태원 서울대 교수, 생명과학 부문 김영준 연세대 교수, 예술 부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등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6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교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양자점, 반도체, 전이금속, 합성수지로 구성된 콜로이드 제조와 분산계의 제어 및 자기조립을 유도하는 콜로이드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광 바이오 기능성 광자결정 구조체를 개발해 상을 수상하게 됐다.
2009.09.22 조회수 15017 -
 이상엽 특훈교수팀, 대사공학기술로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녹색기술 개발
- 화석원료 기반의 화학산업에서 바이오 기반 녹색 화학산업으로 -
우리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45,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바이오융합연구소 공동소장, LG화학 석좌교수)팀이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대장균으로부터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다이아민(diamine)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와일리-블랙웰(Wiley-Blackwell)사가 발간하는 가장 오랜 전통의 공학계열 생명공학 학술지인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지(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7일자 온라인 판으로 소개됐다.
현재, 의약을 제외하고도 1,800조원 시장 규모의 화학 물질들은 주로 화석원료에 기반한 석유화학 공정으로 생산돼 왔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일론 등의 원료로 쓰이는 1,4-다이아미노부탄 (1,4-diaminobutane), 일명 푸트레신 (putrescine)을 석유화학공정이 아닌 포도당이나 설탕과 같은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부터 대사공학으로 개량된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와일리(Wiley)사는 이 연구결과를 향후 석유화학 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기반 화학산업으로 바꾸는데 핵심이 되는 대사공학의 적용 예를 잘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
李 교수는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스템생물학 연구개발 사업의 결실 중에 하나로서, 다이아민을 바이오 기반 환경 친화적인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을 예라고 생각한다. 본 기술에 이용된 시스템대사공학 기법은 다른 화학물질의 바이오 기반 생산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특허 출원된 본 기술 관련하여 박사학위 주제로 잘 수행한 취안지강(Qian Zhi Gang) 박사와 시아샤시아(Xia Xiao Xia) 박사와 함께 다른 다이아민 생산 공정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지의 50주년 기념해를 맞이하여 투고한 본 논문은 학술지의 표지논문, 스포트라이트 논문, 그리고 편집장 우수 논문으로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교수팀은 세계적인 대사공학 연구 전문그륩으로서 이 기술을 이용한 산업바이오텍 기술 개발에서 탁월한 연구 결과들을 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 기반 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李 교수는 내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사공학 학술회의의 의장으로 최근 추대됐으며, 지난 달 미국 듀퐁사,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교, 시스템생물학연구소 등에서 시스템대사공학을 통한 산업바이오텍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는 등 대사공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09.08.31 조회수 16949
이상엽 특훈교수팀, 대사공학기술로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녹색기술 개발
- 화석원료 기반의 화학산업에서 바이오 기반 녹색 화학산업으로 -
우리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45,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바이오융합연구소 공동소장, LG화학 석좌교수)팀이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대장균으로부터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다이아민(diamine)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와일리-블랙웰(Wiley-Blackwell)사가 발간하는 가장 오랜 전통의 공학계열 생명공학 학술지인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지(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7일자 온라인 판으로 소개됐다.
현재, 의약을 제외하고도 1,800조원 시장 규모의 화학 물질들은 주로 화석원료에 기반한 석유화학 공정으로 생산돼 왔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일론 등의 원료로 쓰이는 1,4-다이아미노부탄 (1,4-diaminobutane), 일명 푸트레신 (putrescine)을 석유화학공정이 아닌 포도당이나 설탕과 같은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부터 대사공학으로 개량된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와일리(Wiley)사는 이 연구결과를 향후 석유화학 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기반 화학산업으로 바꾸는데 핵심이 되는 대사공학의 적용 예를 잘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
李 교수는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스템생물학 연구개발 사업의 결실 중에 하나로서, 다이아민을 바이오 기반 환경 친화적인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을 예라고 생각한다. 본 기술에 이용된 시스템대사공학 기법은 다른 화학물질의 바이오 기반 생산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특허 출원된 본 기술 관련하여 박사학위 주제로 잘 수행한 취안지강(Qian Zhi Gang) 박사와 시아샤시아(Xia Xiao Xia) 박사와 함께 다른 다이아민 생산 공정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지의 50주년 기념해를 맞이하여 투고한 본 논문은 학술지의 표지논문, 스포트라이트 논문, 그리고 편집장 우수 논문으로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교수팀은 세계적인 대사공학 연구 전문그륩으로서 이 기술을 이용한 산업바이오텍 기술 개발에서 탁월한 연구 결과들을 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 기반 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李 교수는 내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사공학 학술회의의 의장으로 최근 추대됐으며, 지난 달 미국 듀퐁사,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교, 시스템생물학연구소 등에서 시스템대사공학을 통한 산업바이오텍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는 등 대사공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09.08.31 조회수 16949 -
 강정구 교수연구팀, 코어/쉘 구조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 개발
-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 표지 논문 게재 -
우리대학 강정구 교수팀은 질소가 포함된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코어/쉘 형태의 화학적으로 안정한 초상자성(자성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수많은 전자스핀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대자성 상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구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아 KAIST 강정구(姜正九, 41세) 교수 연구팀(이정우 연구원(박사 4년))의 연구 성과로서, 연구 결과는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인쇄판 표지논문으로 7월 24일 게재될 예정이다. 강 교수는 2008년 12월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표지 게재에 연이은 7개월 만의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다.
현재까지 자성 나노입자의 크기를 제어하여 촉매, 바이오 메디신, 데이터 저장체 등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어 균일한 크기의 나노입자 제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성 나노입자는 합성 후 외부 화학적 분위기에 의해 자성특성이 변화하여 원하는 특성을 유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는 나노입자를 카본나노튜브에 부착(attachment)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카본나노튜브를 산처리 등을 통해 표면에 결함을 생성시켜 용액 내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분산한 다음 나노입자를 나노튜브 표면에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강 교수 연구팀은 나노튜브의 표면에 결함을 생성시키지 않고도 이종원소가 핵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먼저 질소가 포함된 카본나이트라이드(Carbon Nitride) 나노튜브를 성장시킨 후 균일한 크기의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부착시킨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를 합성하였다. 다시 이러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 위에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하여 화학적 분위기에서 자성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는 수중에서도 0.4%의 자화도 변화만 발생하였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X선 흡수분광(X-ray Absorption Spectroscopy) 분석과 더불어 카본나이트라이드 포함된 질소가 균일한 크기의 나노입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하는 자성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강 교수는 “동 연구 성과가 갖는 의미는 질소가 치환된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해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초상자성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혼성체를 합성하고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표면에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하여 자성특성을 외부 화학적 분위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실험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카본나노튜브 내 질소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이고, 미국 특허는 출원 신청하고 있다. 실리카 보호막엔 다른 물질들을 치환시키기 쉬워 형·발광 응용에 가능하고 혼성체 또한 향후 촉매, 바이오 메디신, 데이타 저장체 등으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2009.07.27 조회수 18258
강정구 교수연구팀, 코어/쉘 구조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 개발
-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 표지 논문 게재 -
우리대학 강정구 교수팀은 질소가 포함된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코어/쉘 형태의 화학적으로 안정한 초상자성(자성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수많은 전자스핀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대자성 상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구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아 KAIST 강정구(姜正九, 41세) 교수 연구팀(이정우 연구원(박사 4년))의 연구 성과로서, 연구 결과는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인쇄판 표지논문으로 7월 24일 게재될 예정이다. 강 교수는 2008년 12월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표지 게재에 연이은 7개월 만의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다.
현재까지 자성 나노입자의 크기를 제어하여 촉매, 바이오 메디신, 데이터 저장체 등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어 균일한 크기의 나노입자 제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성 나노입자는 합성 후 외부 화학적 분위기에 의해 자성특성이 변화하여 원하는 특성을 유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는 나노입자를 카본나노튜브에 부착(attachment)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카본나노튜브를 산처리 등을 통해 표면에 결함을 생성시켜 용액 내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분산한 다음 나노입자를 나노튜브 표면에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강 교수 연구팀은 나노튜브의 표면에 결함을 생성시키지 않고도 이종원소가 핵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먼저 질소가 포함된 카본나이트라이드(Carbon Nitride) 나노튜브를 성장시킨 후 균일한 크기의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부착시킨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를 합성하였다. 다시 이러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 위에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하여 화학적 분위기에서 자성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한 나노입자-나노튜브 혼성체는 수중에서도 0.4%의 자화도 변화만 발생하였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X선 흡수분광(X-ray Absorption Spectroscopy) 분석과 더불어 카본나이트라이드 포함된 질소가 균일한 크기의 나노입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하는 자성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강 교수는 “동 연구 성과가 갖는 의미는 질소가 치환된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해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초상자성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혼성체를 합성하고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표면에 실리카 보호막을 코팅하여 자성특성을 외부 화학적 분위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실험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카본나노튜브 내 질소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이고, 미국 특허는 출원 신청하고 있다. 실리카 보호막엔 다른 물질들을 치환시키기 쉬워 형·발광 응용에 가능하고 혼성체 또한 향후 촉매, 바이오 메디신, 데이타 저장체 등으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2009.07.27 조회수 18258 -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국제 대사공학회 의장으로 추대
-내년 6월, 차기 국제 대사공학회 제주도에서 개최
지난주 미국 벌링턴(Burlington, Vermont주)에서 개최된 국제 대사공학 운영위원회는 KAIST(총장 서남표)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45,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LG화학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제8회 국제대사공학회 의장으로 추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for Green Growth)’이란 주제로 내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회에서는 바이오기반 녹색성장 관련 학술 발표와 토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자문회(World Council on Industrial Biotechnology)가 발족되며 창립 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자문회는 세계 산업생명공학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국의 정책수립 등에 자문하게 된다.
우리대학 관계자는 “국제 대사공학회의 국내 개최는 한국의 대사공학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생물로부터 화학물질 및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생명공학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율적인 바이오화학물질 및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미생물의 대사회로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대사공학이 필수적이며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李 교수는 “우리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세계 각국에서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KAIST는 바이오기반 화학물질 및 연료 생산을 시스템대사공학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9.07.16 조회수 15218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국제 대사공학회 의장으로 추대
-내년 6월, 차기 국제 대사공학회 제주도에서 개최
지난주 미국 벌링턴(Burlington, Vermont주)에서 개최된 국제 대사공학 운영위원회는 KAIST(총장 서남표)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45,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LG화학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제8회 국제대사공학회 의장으로 추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for Green Growth)’이란 주제로 내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회에서는 바이오기반 녹색성장 관련 학술 발표와 토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자문회(World Council on Industrial Biotechnology)가 발족되며 창립 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자문회는 세계 산업생명공학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국의 정책수립 등에 자문하게 된다.
우리대학 관계자는 “국제 대사공학회의 국내 개최는 한국의 대사공학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생물로부터 화학물질 및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생명공학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율적인 바이오화학물질 및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미생물의 대사회로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대사공학이 필수적이며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李 교수는 “우리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세계 각국에서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KAIST는 바이오기반 화학물질 및 연료 생산을 시스템대사공학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9.07.16 조회수 15218